<2030 카이스트 미래경고>
를 읽고 생각을 적어 봤습니다.
“10년 후 한국은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
이 책이 던지는 도전적인 질문이다.
우리는 지난 몇 년동안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의 홍수속에서 살아왔다.
그리고 지금은 “포스트코로나”라는 말의 홍수에서 허덕이고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새로운 사회, 기술의 진보, 기준의 변경 등을 이야기하고 예감한다.
그러나 새로운 사회의 패러다임을 단순하게 기술의 진보, 산업의 발전만으로 바라보아서는 안된다. 거기에는 사람이 있고, 사회구성원이 있고, 그들 사이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술과 경제적 변화는 늘 사회적 변동을 가져오고, 사회적 갈등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기존 패러다임에서 절대적 힘의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대재벌, 관료, 고소득층, 고학력층들만의 이해가 일방적으로 관철되면 우리 사회는 IMF 이후 겪었던 사회적 양극화 현상,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겪었던 저소득층과 청년세대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피해를 고스란히 다시 반복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위험한 일이다.
경제적으로는 혁신, 사회적으로는 포용, 정치적으로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혁신적 포용국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지 기득권 주류 세력들의 목소리가 표지갈이 되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창조경제’의 표지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혁신성장’으로 바뀌기만 한 뒤 관료들의 오랜 소망과 재벌들의 오랜 민원들이 뒤섞여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의 홍수와 함께 “한국판 뉴딜”이라는 현란한 표현을 앞세워 발표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2030년, 향후 10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장래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것을 준비하는 데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고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어떤 노력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더불어,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박정희의 경부고속도로>와 <김대중의 인터넷고속도로> 처럼 추진 당시 사회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 정치 지도자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일도 많을 것이다.
이미 배민 갈등과 타다 갈등을 통해 ‘혁신’의 이름만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의 반발과 합의를 무시하고 가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았다.
새로운 단계로의 점프를 위해 기술적 혁신, 시스템의 변화, 패러다임 전환이 있어야 하지만 갈등의 조정, 이해추돌의 완화, 제도적 절충이 없다면 모든 것은 새로운 지옥문을 여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여전히 정치가 답이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180석이라는 거대한 힘으로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지를 가리고 추려서 대한민국의 10년을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
혁신의 에너지를 모으고 분출시키는 것도,
지루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극한의 인내력을 갖는 것도,
미래를 위해 오늘 욕먹을 각오를 하는 결단도,
모두 거대 여당을 만들어 준 국민들이 내밀고 있는 숙제이다.
묵묵히 이 일을 해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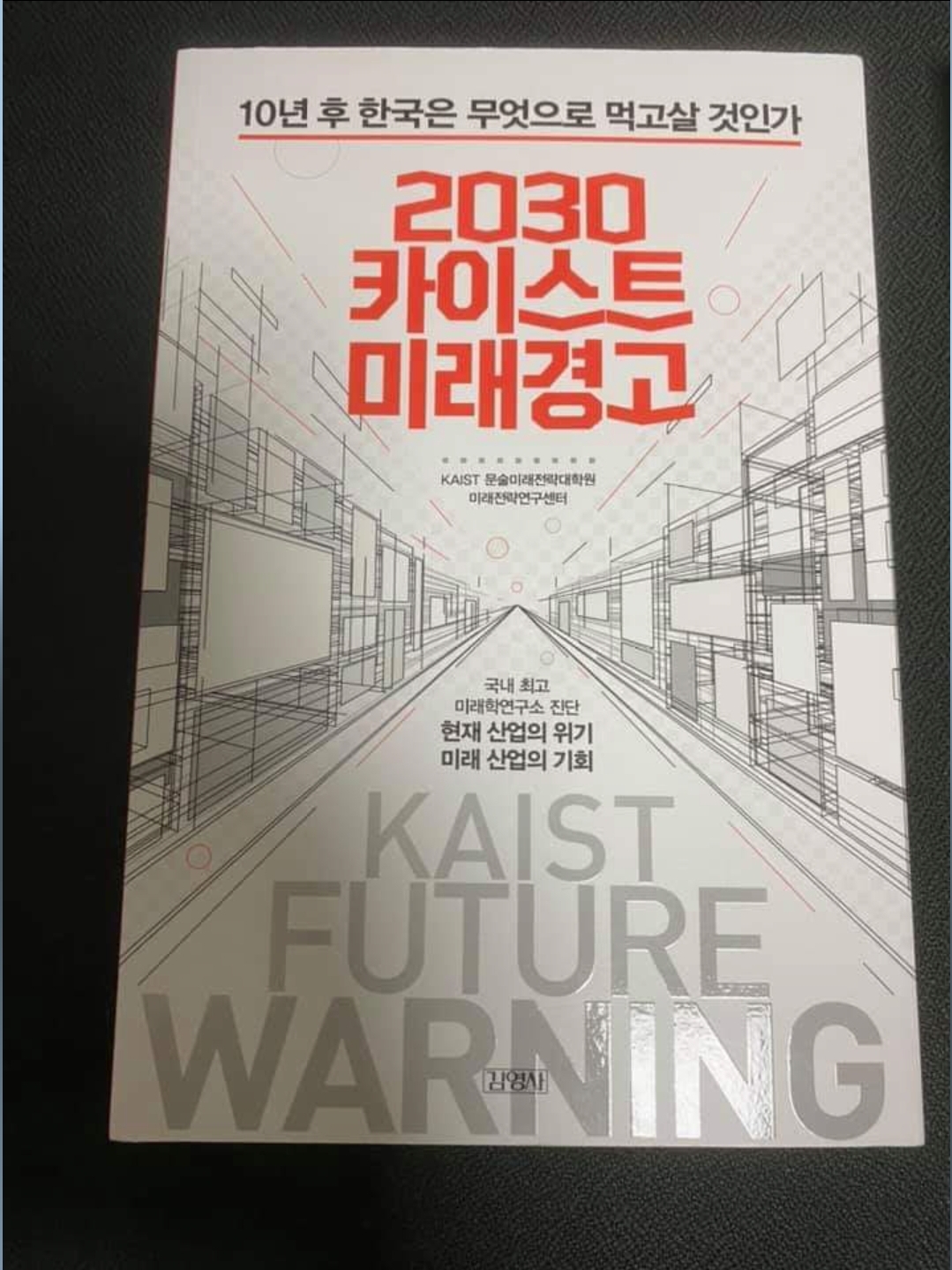
'박용진의 하루 > 박용진의 오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0513] 하도 어이가 없어 공개적으로 글을 올립니다. (0) | 2020.05.13 |
|---|---|
| [200512] 지난 4~5개월 동안 읽은 책들을 소개합니다! ㅎㅎ (0) | 2020.05.12 |
| [200510] 설마가 사람 잡는다! (0) | 2020.05.10 |
| [200508] 오늘밤 12시 20분! JTBC <밤샘토론> 출연합니다! (0) | 2020.05.08 |
| [200506] 불법행위에는 응당한 처벌이 따르는 것이 국민적 상식이다 (0) | 2020.05.06 |



